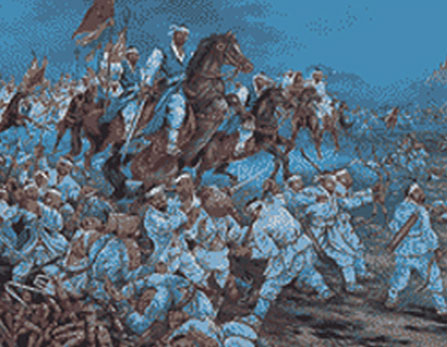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지방 편제는 어느 정도 지방의 호족 세력의 강약을 염두에 두고 시행된 일종의 봉건제도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중앙집권적인 군현제도를 정비하면서도 나주는 목으로 조선조 말기까지 이어졌다. 태조 2년에 각도의 계수관(界首官)을 정하면서 완산, 광주, 나주의 세 곳이 계수관으로 정해졌고, 세종때에는 광주가 빠지고 남원도호부, 장흥도호부, 제주목이 추가되었다.
이때 나주목은 해진, 영암,영광 등 3군과 강진, 무장, 함평, 남평, 무안, 고창, 흥덕, 장성 등 8현을 영속하고 있었다. 계수관제도는 관찰사제도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행정 기능은 관찰사에게 모두 넘어가고 주로 군사조직에 활용되었다. 계수관제가 진관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전남지방의 군사조직은 나주의 병마첨절제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설명
『경국대전』외관직 조에 따르면 나주목에는 정3품의 목사, 종5품의 판관 1명을 두고 목사 아래 좌수 1인, 별감 3인, 군관 50인, 아전 80인, 기생 22인, 사령 41인, 관비 17인이 소속되어 있다.
조선조 나주는 국난극복의 선봉에 있었다. 1592년 임진년 일본 전국시대를 마감한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전국을 평정한 여세를 몰아 조선 침략에 나섰다. 이른 바 ‘明征假道(명나라를 칠 길을 빌림)’를 명분으로 조선에 상륙한 왜군은 3군으로 나누어 파죽시세의 군세로 한양까지 점령하고 선조는 의주까지 몽진하였다. 이때 나주에서는 수원부사를 지낸 김천일이 나주목의 객사인 금성관에 뜻있는 인사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켜 출병하여 북상하여 수원의 독성산성에서 1차로 왜군을 맞아 대승하였다.
선조가 있는 의주에 장계를 올려 선조는 김천일에게 호남창의사(湖南倡義使)칭호를 내리고 장예원 판결사(掌禮阮 判決事)를 제수하였다. 김천일은 이후 권율과 작전을 함께 짜고 지휘를 함께 하는 등 의병장으로써 권율의 행주산성 싸움에 큰 도움을 주었다. 게다가 고립무원의 지경에 처한 진주성에 들어가 주장으로 큰 싸움을 맞게 되었다. 진주성은 호남의 관문이라 진주성을 지키지 못하면 호남의 53성이 짓밟힐 위기에 처하여 김천일은 관군도 아닌 의병장으로 가장 먼저 입성하여 막강한 적의 군세를 막고 병든 몸으로 성과 운명을 함께 하였으며 성이 함락되자 맏아들 상건과 함께 순의의 길을 택하였다. 적은 진주성 싸움에 10만 대병을 동원할 정도로 총력을 기울여 성을 함락시켰으나 수만의 피해를 입어 호남으로 진출할 여력을 잃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후조당 이용제 장군, 김해부사 이종인, 동강면의 최 오 의병장 등 나주의 의병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전국에서 가장 왕성한 의병활동을 벌여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주역이 되었다. 이러한 나주의 의병정신은 진정 나주를 지탱하는 하나의 정신적 원류로서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