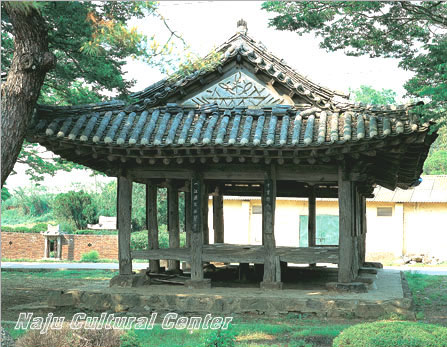
백제 및 통일신라시대
나주를 비롯한 영산강 유역이 백제에 복속된 것은 앞 장에서 논의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가장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동성왕 시대 이후로 보인다.
물론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제의 마한 통합은 온조왕 시대이며,『일본서기』신공기는 영산강 유역의 공략이 근초고왕대(서기 369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게 한다.
백제 및 통일신라시대 설명
나주를 비롯한 영산강 유역이 백제에 복속된 것은 앞 장에서 논의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가장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동성왕 시대 이후로 보인다.
물론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제의 마한 통합은 온조왕 시대이며,『일본서기』신공기는 영산강 유역의 공략이 근초고왕대(서기 369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삼국사기』백제본기 동성왕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20년에 熊津橋(웅진교)를 架設(가설)하였다. 7월에 沙井城(사정성:위치미상)을 쌓고 ?率(한솔) 毗陀(비타)로 鎭戍(진수)케 하였다. 8월에 왕은 耽羅[탐라:濟州島(제주도)]가 貢賦(공부)를 바치지 않으므로 親征(친정)하여 武珍州[무진주:光州(광주)]에까지 이르렀다. 耽羅(탐라)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어 罪(죄)를 청하므로 그만두었다.(…王以耽羅不修貢賦親征至武珍州耽羅聞之遣使乞罪乃止耽羅卽耽牟羅)
20년에 熊津橋(웅진교)를 架設(가설)하였다. 7월에 沙井城(사정성:위치미상)을 쌓고 ?率(한솔) 毗陀(비타)로 鎭戍(진수)케 하였다. 8월에 왕은 耽羅[탐라:濟州島(제주도)]가 貢賦(공부)를 바치지 않으므로 親征(친정)하여 武珍州[무진주:光州(광주)]에까지 이르렀다. 耽羅(탐라)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어 罪(죄)를 청하므로 그만두었다.(…王以耽羅不修貢賦親征至武珍州耽羅聞之遣使乞罪乃止耽羅卽耽牟羅)
이 기록을 보면 동성왕이 백제의 발달한 항해술을 두고 육로로 친정하여 무력시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나마 무진주에 머물렀다는 것은 아직 영산강 유역을 복속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 기록을 근거로 영산강 유역은 강력한 토착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고, 개로왕이 장수왕에게 패하여 죽은 이후 웅진으로 천도한 문주왕대부터 성왕 이전까지는 남쪽보다는 신라와 고구려와의 투쟁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영산강 유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치권을 인정하였으리라는 것도 그리 큰 억측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한성 이남의 땅을 고구려에 상실하고 웅진으로 천도하였다가 다시 사비로 천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산강 유역을 공략하였다는 것이 차라리 고고학적 발굴성과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백제가 영산강 유역을 지배한 것은 어쩌면 1세기 정도밖에 안되는 기간일 수도 있다.
백제는 6세기 중반 이후에야 영산강 유역에 할거하던 독자적인 고대 연맹체를 해체시키고 직접 지배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대 연맹체의 중심지였던 반남면 일대에 대하여 하위의 행정단위인 일개 성(반나부리성)으로 편제하였고, 대신 나주시내 일대에 대해서는 그보다 상위의 행정단위인 군(발라군)으로 편제하였다. 이는 기왕의 토착 맹주세력을 억누르면서 새로운 지역의 세력집단을 중심으로 재편성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후 서기 660년에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고 당은 지배야욕을 드러내어 전남 지역에 사반주, 대방주, 분차주의 3주를 설치하려 하였고, 이 가운데 나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방주였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신라에 의해 축출된다.
서기 667년 당군을 완전히 축출하고 난 후 신라는 전국을 9주로 편제하고 나주를 발라주(發羅州)로 승격시켜 오늘날의 전남지방을 관할하는 치소로 삼았다. 이는 영산강 유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였음을 통일신라가 인정했음을 뜻한다. 이는 과거 백제가 고대 옹관고분사회의 중심지였던 반남 지역을 반나부리현이라는 일개 현으로 강등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토착세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인지 발라주는 9년만에 발라군으로 강등되고 무진군(지금의 광주)을 무진주로 승격시켜 무진주 중심의 지방편제로 개편하고 반남지역은 다시 반남군으로 승격시켰다. 이와 함께 신라의 군사조직인 10정 가운데 미다부리정을 미동부리현에 설치하여 무진주 관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토착세력을 통제하게 한다.
이후 발라군은 경덕왕 16년에 금산군(錦山郡)으로 중국식 지방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 신라와 중국과 일본을 망라한 해상무역왕인 청해진 대사 장보고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다. 청해진 대사란 관직은 신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명으로 신라의 중앙정부가 장보고의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이다. 나주와 장보고의 인연은 철야현에서 있었던 민애왕과의 격전으로 알려져 있다. 흥덕왕이 후사가 없이 죽고 난 후 균정과 제륭이 왕위쟁탈전에서 균정이 패하면서 균정의 아들 우징이 청해진에 도움을 요청했다. 장보고는 즉시 군사를 일으켜 경주로 향했다. 장보고군은 무진주 속현이었던 철야현에서 부딪혀 크게 승리하고 경주까지 가서 우징을 신무왕으로 등극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딸을 신무왕의 뒤를 이은 문성왕의 왕후가 되기를 바랐으나 폐쇄적인 신분제도를 가진 신라가 이를 용인하지 않아 장보고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경주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무진주의 염장을 보내 장보고를 살해하고 청해진을 와해시키고 말았다. 당시 나주는 장보고의 영향력 아래 중국의 산동반도와 해상교역을 했다고 하며 청해진의 와해로 인하여 신라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싹텄으리라 추측된다.
지방의 치소였던 무진주와 그 군사력이 집결된 미다부리정은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곳이었고, 해상무역을 해온 나주지방의 호족들과는 점차 대립관계가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앙에서 방수군의 장수로 무진주에 온 견훤이 세운 후백제와 다른 길을 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